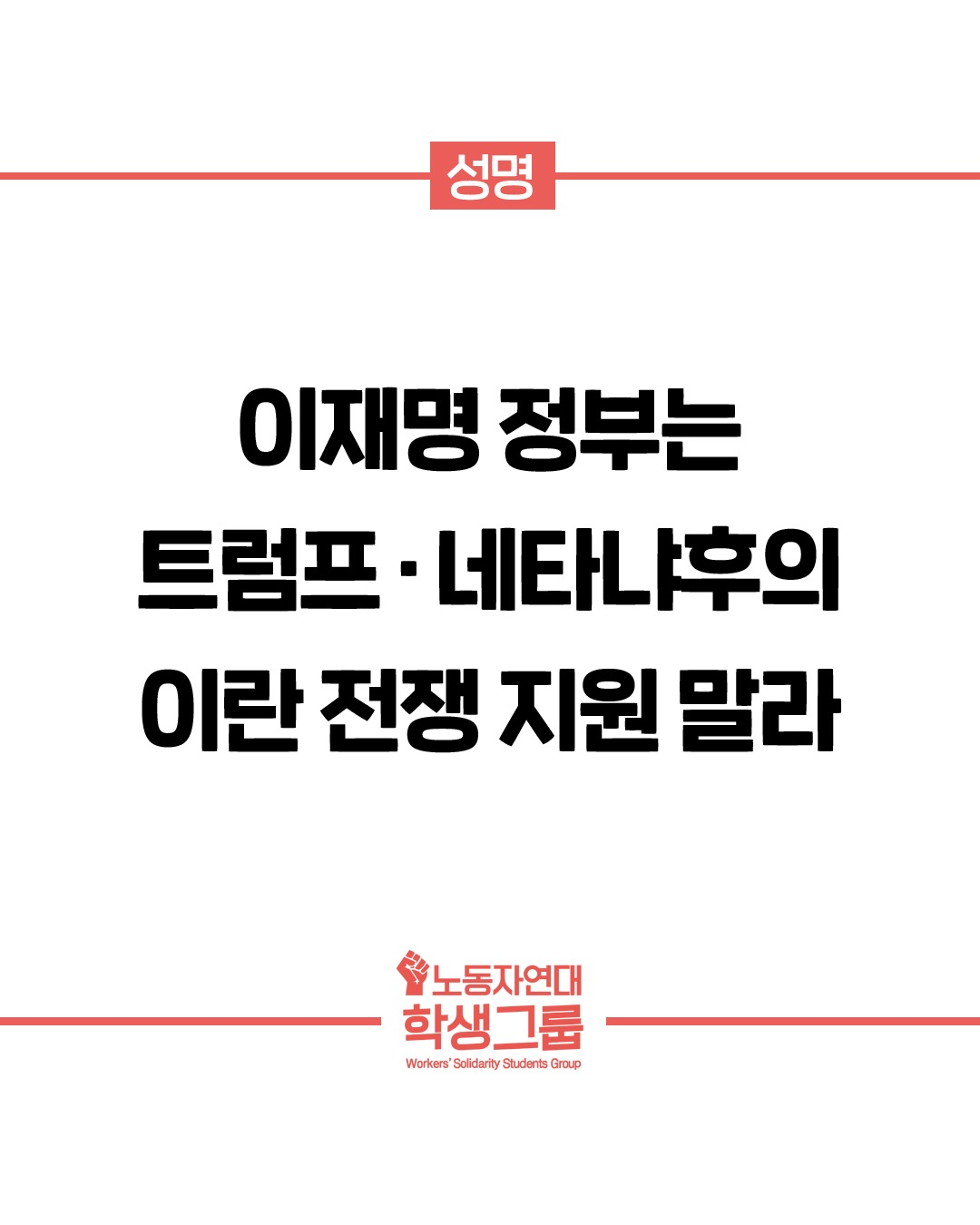<레프트21> 76호 (3월 3일 발행) 기사입니다.
등록금, ‘찔끔’이 아니라 ‘대폭’ 인하하라
성지현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이 평균 4.5퍼센트 내렸다.
그중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들의 인하율은 2~3퍼센트에 그쳤다.
이는 반값등록금은커녕,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회계 운영만 해도 등록금 12.5퍼센트 인하할 수 있다’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조차 무시한 것이다.
여전히 대학 평균 등록금은 한해 6백70만 원(국공립대학 4백15만 원, 사립대 7백37만 원)으로 절대적으로 높다.
게다가 대학들은 이런 소폭 인하의 비용조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양대, 광운대 등은 수업일수를 줄였고, 동아대는 교과 자체를 대폭 없앴다. 시간강사들의 수업을 줄이고, 원래 있던 장학금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줄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사실상 20퍼센트 인하 효과가 난다”면서 생색내기 바쁘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은 “등록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하됐으니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그러나 졸업하는 동시에 1천3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 쇼가 아니다.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이미 불법으로 판결 난 기성회비는 폐지돼야 하고, 국공립대의 애초 취지대로 정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투쟁의 결합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정부가 사립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약 7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실현하려면, 학교 당국과 정부에 맞선 투쟁 모두가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라도 학내에서의 투쟁에 기권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학내에서 대중 운동이 잘 건설돼야 자신감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정부를 향한 투쟁에도 더 잘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학내에서 투쟁이 활발하고 성과를 거뒀던 경희대나 동국대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집회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활력 있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소폭 인하를 규탄하고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은 3월 30일에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을 결합시키며 건설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