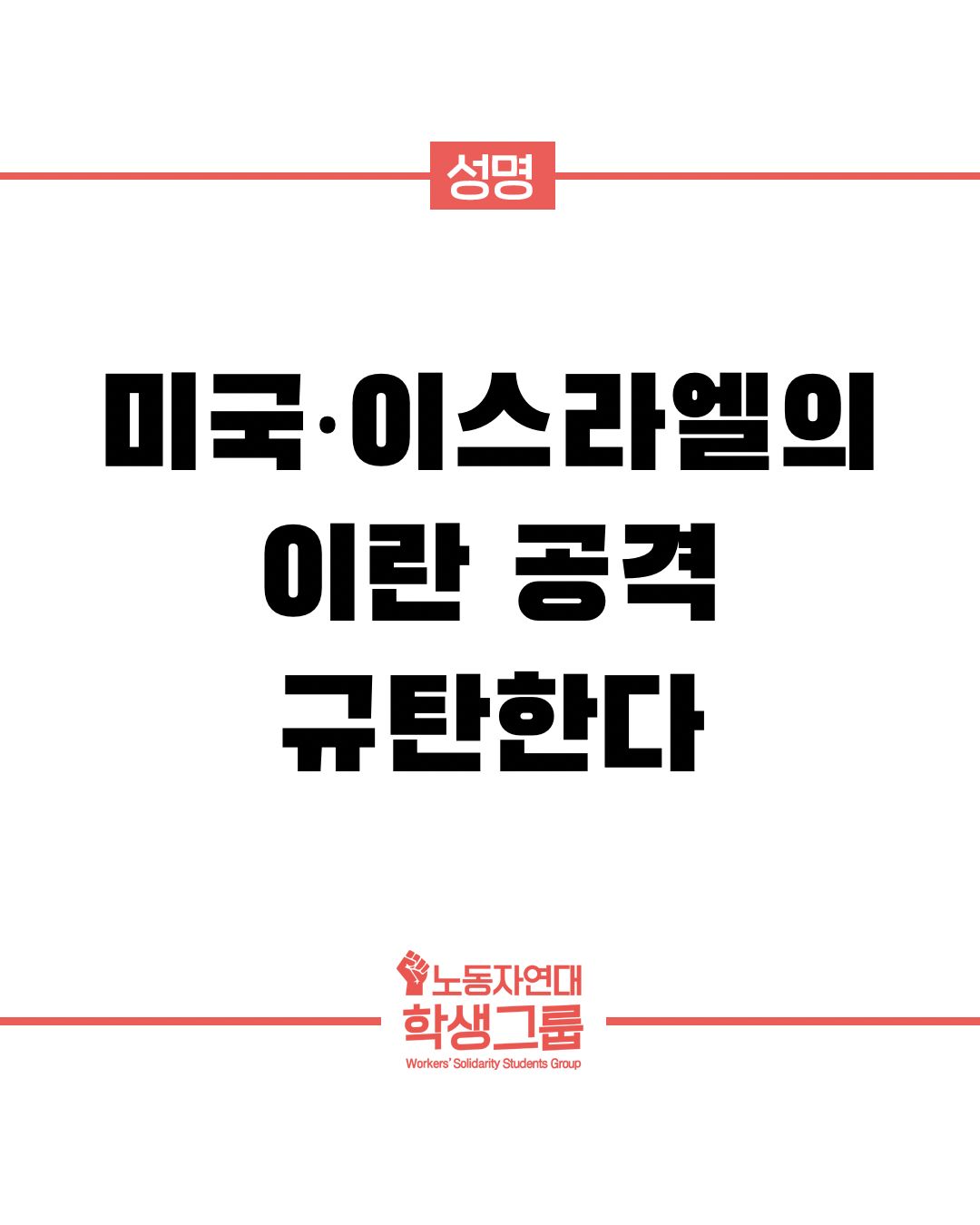양선경(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빠라짓 뽀무 외 지음, 이기주 옮김, 삶창, 260쪽, 12000원)는 네팔 이주노동자 서른다섯 명이 쓴 시를 번역한 시집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집에는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사는 삶의 애환이 담겼다.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빠라짓 뽀무 외 지음, 이기주 옮김, 삶창, 260쪽, 12000원)는 네팔 이주노동자 서른다섯 명이 쓴 시를 번역한 시집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집에는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사는 삶의 애환이 담겼다.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한다. 사장들에게 온갖 억압과 수모를 겪어도 미등록 신분이 될까 봐, 한국에서 쫓겨날까 봐 반발하기도 어렵다. 시집에서는 기계가 된 듯,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하루는 삶에 너무도 지쳐서 / 내가 말했어요 / 사장님, 당신은 내 굶주림과 결핍을 해결해주셨어요 /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 이제는 나를 죽게 해주세요 //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알았어 /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 그리고 내일 죽으렴!(‘고용’, 러메스 사연)
저녁에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구나 /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 여기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 기계가 사람을 작동시킨다(‘기계’, 서로즈 서르버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꿈을 안고서 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한국에 온다. 그러나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가 너무나 힘겹다.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쥐꼬리만한 임금마저도 숙식비(비닐하우스나 사람이 도저히 살기 어려운 곳이 숙소라면서) 등 갖가지 이유로 사장들에게 떼이기 일쑤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위험한 작업장에서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이고,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의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4.6퍼센트임을 고려하면 매우 큰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발생 건수도 많지만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은폐도 그만큼 많아서 실제로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악랄한 단속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야만적 단속추방으로 두 명이 사망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
아……, 할 수 없습니다 / 내일 깨어날 수 있을지, 깨어날 수 없을지 / 하지만 나는 잠을 자야겠어요(‘낯선 나라에서’, 니르거라즈 라이)
그러나 책을 덮을 때가 되면, 독자들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왔다. 이 책에는 고국의 독재를 비판하고 투쟁했던 경험이 엿보이는 작품들도 있다. 한국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들도 있는데, 한 편씩 읽다 보면 이들도 우리와 같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해 이주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한국 정부와 사장들의 가혹한 억압에 반대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 왔다. 고용허가제보다 끔찍했던 산업연수제를 폐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한 결과였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심정을 공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시집을 추천한다.